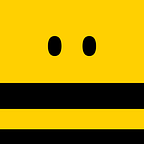2016년 프라하, 베를린으로 가는 티켓 <Open Your Letter>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건 작년 9월. 단순히 뉴스레터라는 포맷을 사용하는 것 이전에는 어떤 콘텐츠를 왜 뉴스레터라는 방식으로 보내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요즘 시대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메일이라는 형식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은 ‘메일’함에는 각종 가입한 사이트 관련 홍보물 혹은 구독한 뉴스레터로 가득하지만, SNS가 생기기 전에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역할을 할 때가 있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간간히 그러한 메일을 받을 때의 설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특별할 것 없던 메일함에 오직 나를 위한 메일이 도착해 있을 때의 반가움이란!
그러다 문득 2019년에 발행한 후 1000권만 판매 후 현재는 잠정 절판된 나의 독립출판물 <무과수의 기록>이 떠올랐다. 2016년도 다섯 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글을 사진과 함께 엮어서 발행한 책이었는데 다른 시리즈를 다 낼 때까지는 추가 인쇄를 하지 않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으로 인해 책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시원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였다.
2016년도 다섯 개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쓴 글 <무과수의 기록>
이 책을 단순히 전자출판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가장 전달해줄 수 있는 포맷이 뭘까 고민해보니 ‘유료 뉴스레터’가 생각이 났다. 그러자 저절로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2016년도에 그날에 보낸 메일을 현재의 내가 받는다면? (예를 들면 2016년 9월 1일의 이야기를 2022년 9월 1일에 메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나의 여행 이야기는 특별한 에피소드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이 많아서 독자에게 평온함과 설렘을 모두 선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6년에 <주고받는, 사이>라는 편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 어쩌다 대관령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카페 앞에 있던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저 우체통에 편지를 받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곧장 블로그에 편지를 써주면 그 편지를 프라하에 들고 가서 답장을 하겠다고 했다. 그때 답장을 메일로 했었는데, 오랜만에 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그 경험이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다.
이메일의 특징을 살린 편지 형식의 뉴스레터, <Open Your Letter>
기존 책은 독백의 에세이 형식이었는데, 뉴스레터에 있는 메일 머지 기능으로 ‘00님’하고 각 개인의 이름을 넣어 보내는 기능을 최대한 살려 편지 형식으로 바꿔서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Open Your Letter>라는 이름으로 잠시 꽁꽁 잠들어 있던 9월의 프라하, 11월 베를린 이야기를 다시 독자에게 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책과 차별화를 하되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어떻게 고스란히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번 글을 보낼 때 다수가 아닌 한 사람에게 보낸다는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2016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걸 빌미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었기 때문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메일을 보내는 시간대도 다르고, 날짜도 다른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으면 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마무리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다음을 기약하기도 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시간만큼이라도 숨통을 틔우며 충분히 느끼고 생각하길 바랐다.
현실적인 고민으로는 구독료 책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였다. 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간한 책 내용을 온라인화 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시 문체를 다 수정해야 했고 편지 봉투 이미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매일 달라져서 품이 꽤 들기 때문이다. 일단 처음이기도 했고 절판된 책을 기다리던 독자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1만 원(30편의 글)’으로 책정을 했다.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차이가 유통과 제작의 관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나에게는 똑같이 소중한 글이라서 다음부터는 제 값으로 받을 예정이다. 조금 더 글의 가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유료 구독 서비스로 진행하지만 단순히 글을 구매한다의 느낌이 아닌 ‘해외에서 오는 편지를 받는다’라는 경험을 강화하고 싶어서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예를 들면 구독이라는 말보다는 ‘Buy a Praha ticket’으로 표현해 관련된 경험을 구매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확실히 ‘유료 구독료’보다는 티켓값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여행을 시작하는 설렘으로 글을 기다리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된다.
글은 보통 특정 독자가 아닌 스스로 하는 독백에 가까워서 종종 공허할 때가 있는데, 구독자가 있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기에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글을 쓰는 내내 나의 편지를 받게 될 이름 모를 사람들의 감정을 어렴풋이 떠올리며 행복한 마음으로 한 달을 살았다.
이미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메일은 또 다른 느낌
구독자 중에서는 이미 책을 구매하신 분도 많았는데, 뉴스레터는 중간중간 이름이 불리는 경험이 너무 색달랐다고 했다. 같은 이야기인데도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뉴스레터 덕분에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냐에 따라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편지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한 장의 편지를 쓰고, 여러 개의 답장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었다. 내가 메일을 보낸 날짜에 해당하는 여행 기록을 들춰 그날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여행 사진을 함께 공유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내가 묻는 질문에 진지한 고민을 담아 보내는 사람도 있으며, 뉴스레터가 종료되고 한 참 지나 이제야 글을 읽고 있다며 답장을 보내는 이도 있다. 뉴스레터의 장점은 구독자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그들의 답장은 언제 어떻게 받아도 읽는 내내 행복함이 차오른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이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올해도 편지를 보낼 그날을 기다린다. 똑같은 이야기를 보낼지라도 받는 이는 달라질 테니까. 또 어떤 답장을 받게 될지, 벌써부터 설렌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고 싶다
최근에 읽은 스티비 담당자의 인터뷰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뉴스레터의 본질은 구독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표현한 부분이었다. 단순히 ‘뉴스레터를 운영한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더 초점을 두다 보니 콘텐츠 발행과 수익과 상관없이 더 큰 만족을 얻게 됐다. 이런 마음이 드니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지속성’이 생기게 됐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들었다.
<Open Your Letter>외에도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계속해서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고 싶다. 다만 정보나 방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누고 싶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행복일 수 있다면 기꺼이 써 내려가고 싶다.